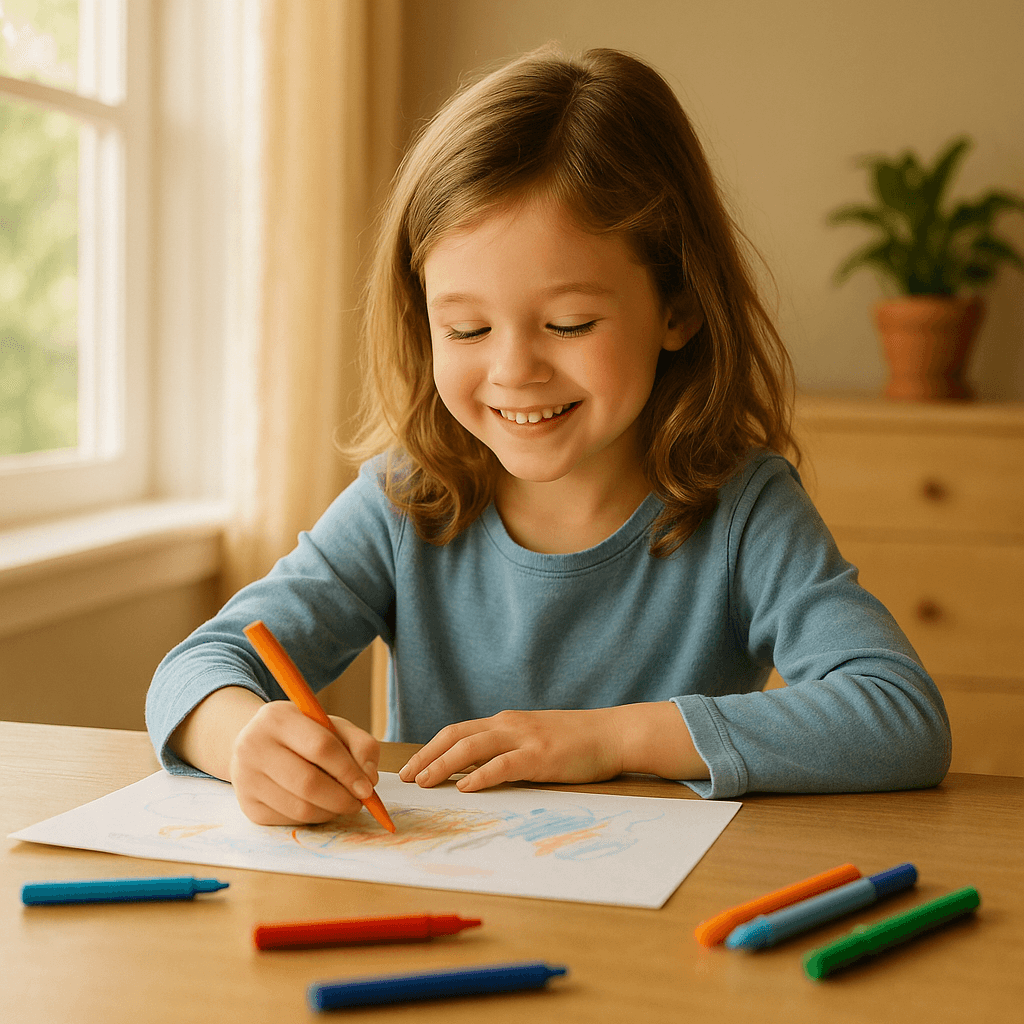
서론: 깨진 가정 속에서의 불안한 성장
가정폭력은 아동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회피 등은 가정폭력 아동이 흔히 겪는 심리적 결과다. 영화 <드림홈>은 폭력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찾아 나서는 한 아동의 여정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 아동이 경험한 외상적 환경을 인식하고,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개입을 통해 회복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사회적 자원 연계, 가족기능 회복, 트라우마 인식 기반의 접근(Trauma-Informed Care)이 필수적이다.
본론: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회복 과정과 사회복지 개입
1.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
가정폭력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복된 폭력 경험은 ‘세상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기존중감의 결여로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기비하 경향을 보이며, 회피적 애착을 형성하기 쉽다. 사회복지사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이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을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회복적 개입: 안정감 형성과 자기표현의 회복
트라우마 회복의 첫 단계는 ‘안전감의 재확립’이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스스로 통제감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은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감정을 안전하게 드러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촉진하며, 아동 스스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3. 가족 개입과 사회적 지지망의 재구성
가정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체계의 문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멘토나 친구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보호망(social safety net)’ 강화를 의미한다.
4.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가정폭력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자(mandatory reporter)로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고 자율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결론: 상처를 넘어, 새로운 ‘드림홈’으로
<드림홈>은 단순히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회복의 주체로 성장하는 아동’을 그린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영화는 ‘상처의 인정’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가정’이라는 이름의 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는 존재다.
드림홈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신뢰와 사랑이 깃든 ‘심리적 안식처’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결국, 사회복지의 목표는 모든 아동이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