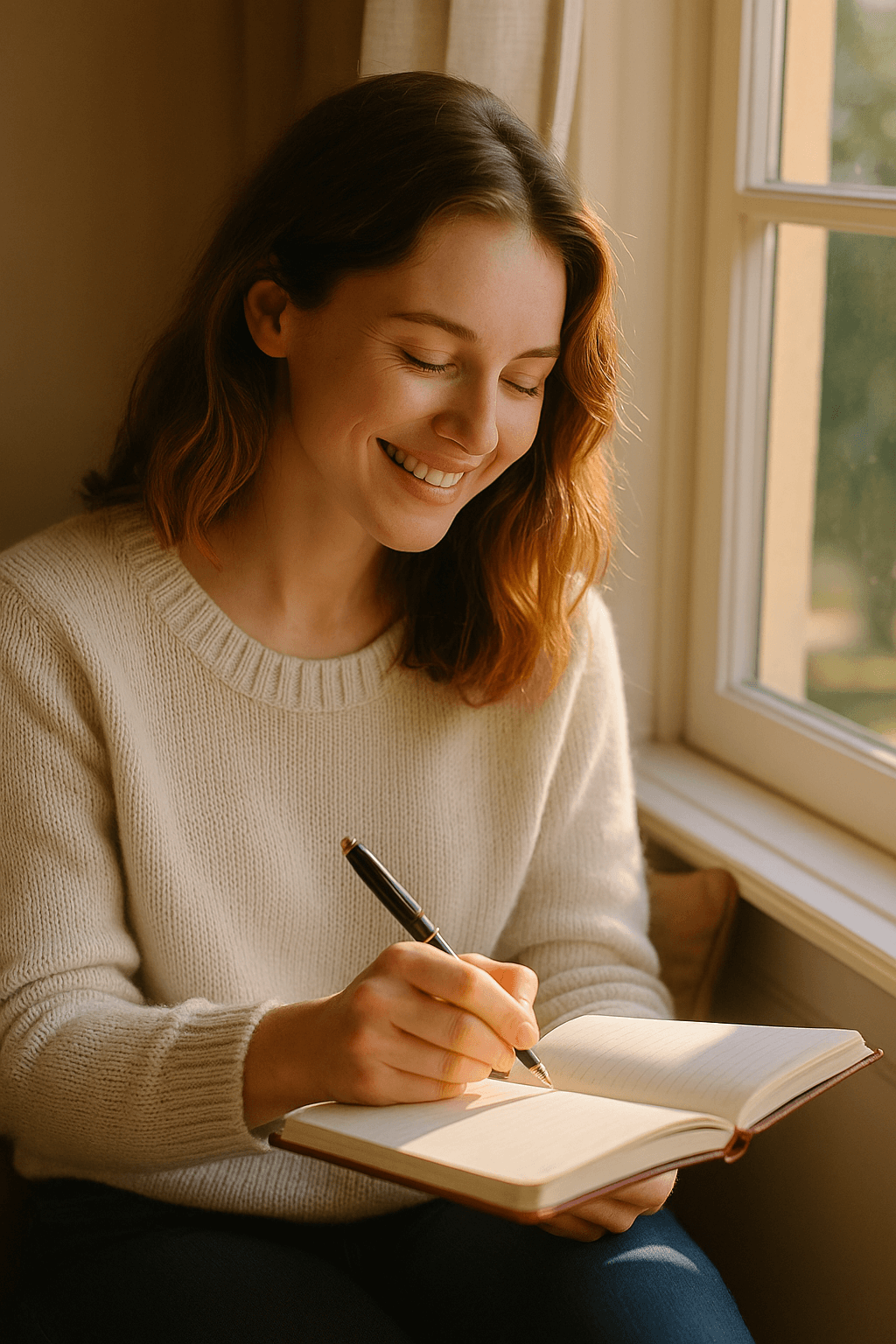
서론: 타인의 시선 속에서 길을 잃은 나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30대 싱글 여성 브리짓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압박 — 결혼, 외모, 커리어 —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매일 ‘다이어트 실패’, ‘연애 실패’, ‘직장 내 모욕’ 등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자조 섞인 농담으로 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짓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자아를 찾아간다.
이 영화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개인이 자기결정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다룬 심리사회적 성장 서사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자아정체성 탐색 과정을 이해하고, 자기비하·자기비판에 빠진 내담자가 스스로의 내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론: 자존감 향상과 자기결정의 사회복지적 분석
1. 사회적 비교와 낮은 자존감의 문제
브리짓은 주변의 기대와 비교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한다.
‘날씬하지 않다’, ‘성공하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로 인한 왜곡된 자기 인식의 결과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내면화된 부정적 사고를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교정하고,
자기존중감(self-respect)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과 주체적 선택
브리짓은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만, 점차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간다.
이는 데시와 라이언(Deci & Ryan)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말하는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회복 과정과 일치한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가 외부 통제(external control)가 아닌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강화하도록
자기결정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아성장 워크숍, 상담개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3. 관계 속 자아 찾기: 진정성(authenticity)의 회복
브리짓은 자신을 꾸미려는 가식적인 관계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
이는 ‘진정성 있는 관계(authentic relationship)’가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가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존중 기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술 훈련(Social Skills Training)을 제공할 수 있다.
4. 실패의 수용과 회복탄력성
브리짓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다이어트 실패, 연애 실패, 사회적 낙인 모두를 겪으면서도 결국 자신을 받아들인다.
이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핵심이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가 실패를 자기부정의 근거가 아닌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심리교육(psychological education)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과 자기결정의 본질을 일깨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힘이다.”
사회복지는 바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