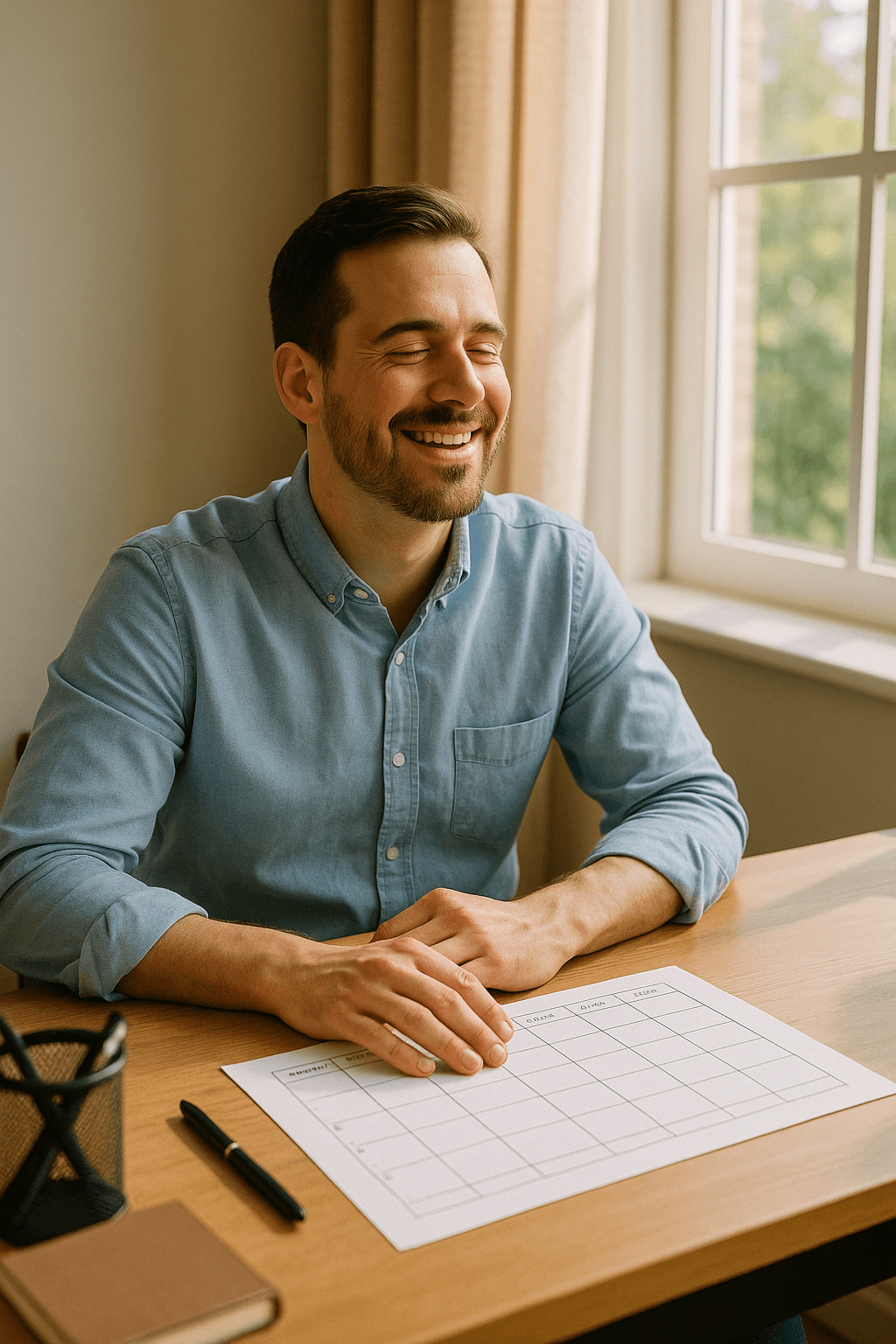
서론: 완벽함에 갇힌 인간, 불안의 그림자
영화 <플랜맨>의 주인공 정석은 철저한 계획과 시간 관리, 규칙적인 생활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는 모든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다스리려 하지만, 그 속엔 불완전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강박적 완벽주의(obsessive perfectionism)’는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장벽이 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통제 상실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려는 ‘부적응적 대처 전략’으로 이해된다.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은 관계 속에서 실수를 두려워하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쓴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으로 이어진다.
정석의 이야기는 ‘통제’에서 ‘관계로’의 전환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본론: 완벽주의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사회복지 개입
1. 완벽주의의 심리적 구조
정석은 일상 속 모든 변수를 통제하며 살아간다.
이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막는다.
심리학적으로 완벽주의자는 자아존중감이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패를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내담자에게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촉진하고,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의 가치를 인식시켜야 한다.
2. 관계 회복과 사회적 적응
정석은 즉흥적인 성격의 여성 ‘소정’을 만나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녀를 통해 그는 계획에 없던 감정, 실수,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실천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능 회복(social functioning restoration)’과 유사하다.
내담자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을 재습득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3. 인지행동적 개입(CBT)과 감정 인식 훈련
사회복지사는 완벽주의적 사고의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을 수정하기 위해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를 활용할 수 있다.
예: “실수는 실패다” → “실수는 성장의 일부다”로 재구조화.
또한 감정 인식 훈련(emotion recognition training)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4. 사회적 지지망 구축
정석의 회복은 관계를 통한 치유였다.
그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신뢰를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가 지역사회, 가족, 친구 관계 속에서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을 연결해야 한다.
결론: 완벽함이 아닌, 인간다움으로
<플랜맨>은 완벽함을 향한 강박이 아닌, 인간다운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됨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기통제를 내려놓고,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완벽주의를 치유하는 길은 ‘계획된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다.
사회복지는 그 여정을 동행하는 따뜻한 동반자다.